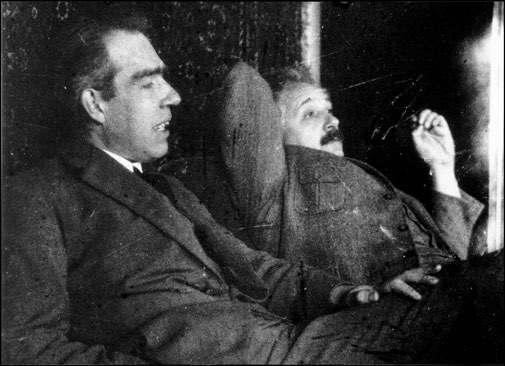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31 |
- 평가문화
- 물리주의
- 명석판명
- 스포츠물리학
- 평가사회
- 측정문제
- 확률해석
- 인문적삶
- 보편자논쟁
- 실재론
- 존재와속성
- 시공간연속성
- 방법론적회의
- 야구물리학
- 동일자문제
- 칸트비판
- 중세철학
- 본유 관념
- 악플문화
- 충격점
- 개별화원리
- 아리스토텔레스
- 합리론 경험론
- 인식주체
- 플라톤
- 타인의평가
- 참여문제
- 코기토논증
- 질료형상론
- 성숙한사회
- Today
- Total
Jacobyechankim
부정적분, 신, potential function, 실재, 초월, 엔트로피의 연관성을 찾아서 본문
방금 아빠와 부정적분의 어려움과 신, 이데아와의 관련성을 시작으로 존재와 potential function, 명상을 통한 해탈, 초월과 신, 그리고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다만 매 페이즈마다 그 다음 페이즈로의 이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언가 느낌을 받으며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이 모든 것들의 연관성은 분명 있는 것 같으며, 심오한 어떤 것임에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오늘 몇년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고민해왔던 부정적분의 어려움에 대한 실마리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찾을 수 있었다. 정말 웃긴 얘기이지만, 실로 그러했다. 고민했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분은 어떤 함수든 주어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에 복잡한 함수나 복잡하지 않더라도 초월함수들로 이루어진 함수들은 적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이며 오히려 부정적분이 가능한 경우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도 부정적분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에는 많은 고충과 고됨이 잇따르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분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적분은 그러한가? 단순히 미분은 주어진 함수를 다항 함수로 나누어서 극한 값을 구하는 것이고, 적분은 모든 정의역을 다 더하는 무한한 시그마 연산이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나의 질문은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왜 그것이 인간의 인식 형식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려워야만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내 친구는 이것이 엔트로피를 국부적으로 낮추는 것이기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지 않을까 하고는 적분과 엔트로피의 관계를 생각한다.
이 모든 질문은 이 친구가 제시했는데,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주목을 이끄는 거대한 질문이라고 느껴진다. 한편, 나는 몇주 전 철학개론 수업을 들으며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살펴보았었고, 며칠 전부터는 프리초프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에서 동양적 신비주의의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나의 이 모든 맥락적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에서 들은 설교는 나의 질문에 대한 해결책의 큰 실마리를 줄 수 있었다. 방금 아빠와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잘 기록이 되기는 할지 모르겠지만(자세히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이한 내용들을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지 두려운 점이 있다)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극우, 극좌와 중용: 변증법과 양자역학적 통찰로 본 시민의식 혁신 (0) | 2025.01.26 |
|---|---|
| 아빠와의 대화, 그리고 나 (0) | 2024.09.22 |
| 어바웃 타임의 철학적 문제: 자아 동일성 문제와 타임머신, 순간이동 (2) | 2024.01.30 |
| 타인의 평가 (0) | 2023.12.16 |
|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에 대한 모어와 드레츠키의 반박은 적절한가? (0) | 2023.09.13 |